
<이향신 권사?
커텐이 드리워진 병실, 나만의 공간에서 풋사과 하나를 꺼내 깎아먹는다. 상큼한 이 맛! 얼마나 먹고싶던 맛인가. 이 맛을 정말 그리워 하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덧 오십년이 지난 이 아침 우아한 식탁이 아닌, 창가의 풍경도 없는 곳에서 그 풋사과를 먹고 있다. 병실 한켠인들 어떠리, 나는 지금 사각 사각 풋사과를 먹으며 행복해하고 있다.
공릉동 안마을에 살던 어린 임산부는 입덧이 심했다. 풋사과가 먹고 싶었으나, 하지만 먹지 못했던 안타까운 기억이 있다.
입덧도 지나 달이 차고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다. 병원은 고사하고 조산원도 못가고 이웃 어른들의 도움으로 집에서 출산을 했다.
하필 함몰 젖으로 수유도 할 수 없었다. 아가를 위해 정부미 한포대를 풀어 놓고 밥상 위에서 쌀과 보리를 분리했다.쌀은 빻아 미음으로 아기에게 먹이고 골라 남은 보리만 어른들의 차지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남편은 잡곡밥을 싫어한다.
그렇게 가난 속에서 태어났지만 아기는 건강하게 잘 자라 어느덧 자랑스런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이번엔 병원에 입원하러가는 내 손을 붙잡고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있었다.
딸이 집으로 가는가 싶더니 병원앞 과일가게에서 샀다며 파릇한 풋사과와 방울 토마토를 내놓는다.
‘네가 뱃속에 있을 때 애미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풋사과를 네 손으로 사서 나에게 주다니,…’
말은 안해도 대견하고 고맙다.
“엄마가 너 입덧 할 때 먹고 싶었던게 이 풋사과였어. 고맙다.”
하며 과일 봉지를 받았다. 그리고, 이 아침 나는 병실 안에서 오십년 전 어린 임산부가 되어 사각사각 사과를 먹는다. 씹힌 사과의 맛과 향이 목으로 넘어가며 오십년전 설움도 씻은 행복한 아침을 맞게한다.
그날의 풋사과 와 내가 젠탱글그림으로 그린 사과를 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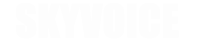



 닛산 맥시마
닛산 맥시마
 "My Tribute"
"My Tribute"
